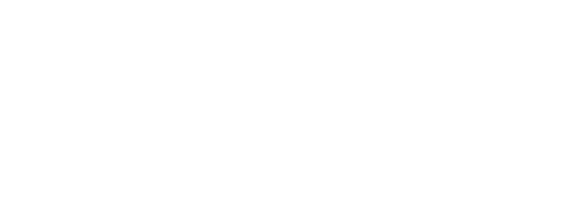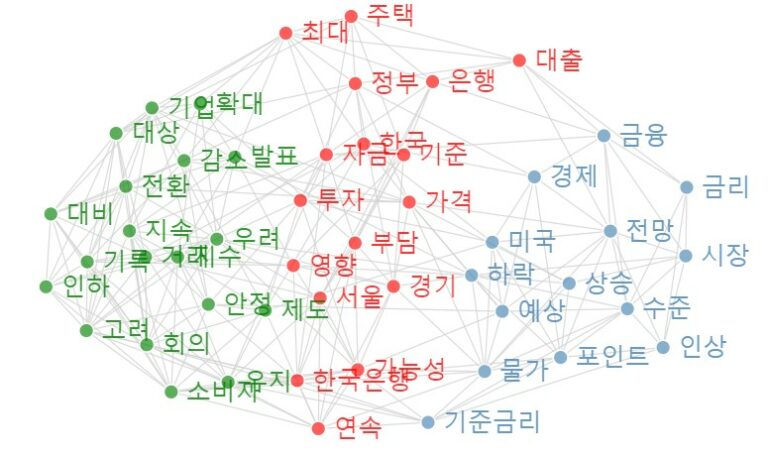[기자수첩] 벤처투자, 네이버 포스트, 그리고 수명 다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경쟁 줄어들며 업무 역량 부족한 신입 직원들 유입돼 최고 선호 직군 외국계 IB에서 벤처기업으로 대거 이동 빡빡한 증권사 대신 워라밸 챙길 수 있는 대체 옵션도 늘어
한 젊은 남자 벤처 사업가가 모 국내 증권사의 여성 애널리스트와 ‘선’을 봤던 일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 여성이 남성에게 ‘회사 매출액이 얼마냐’,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등 만남 자리에서 연봉 질문까지 하는 통에 불편함을 겪었다는 이야기였다. 어떻게 답변했냐고 물었더니 “RA(Research Analyst, 증권사 애널리스트 중 사원, 대리급 직원)라면서 우리 회사 감사보고서도 안 보고 왔냐?”고 쏘아붙였다는 답이 돌아왔다.
사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갑-을’관계에 있어 항상 ‘을’이다. IB 업계 담당자들과 달리 회사 재무 자료 이외의 내부 기밀은 비공개인 만큼, 상장 회사의 IR팀이 공개해주는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쓰기는 어렵다. 때문에 IR팀이 싫어할 만한 이야기들을 보고서에 함부로 싣는 경우는 드물다. 가끔 ‘매도(Sell)’ 의견을 내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용기가 대단하다’고 입에 오르내릴 정도다.
위의 벤처 사업가와 애널리스트와의 일화가 기업의 ‘갑-을’관계로 해석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요즘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른바 ‘사양 직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 중 하나로 보인다.
업무 역량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의 유입
첫째, 애널리스트가 제대로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기업 IR팀과 미팅하는 것 자체부터 실례인 데다 기업 미팅은 아니어도 회사 CEO를 만나는 자리에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갔다는 것은 제대로 훈련된 애널리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애널리스트 평균 연봉은 1억~2억, 몸값이 높은 경우는 3억인 경우도 있으나 정작 연차가 낮은 RA급에서 우수 애널리스트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계의 소문을 확인시켜준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외국계 증권사는 해외 명문대와 이른바 ‘SKY’가 아닌 학벌의 경우는 거의 취업이 불가능했고, 국내 증권사도 몇몇 스타 애널리스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벌의 벽을 넘기조차 쉽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학력’, ‘학벌’ 등에서 크게 부족한 인력들을 뽑아야 했다는 것이 2016년까지 모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다 펀드매니저로 전직한 A씨의 증언이다.
벤처기업들의 엄청난 성장
둘째, 2000년대 중반에는 벤처기업이 일부 게임사와 안랩 등을 제외하고는 중소형 업체였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내는 경우도 드물었고, 애널리스트가 감사보고서를 찾아보고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벤처 사업가 입장에서도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할 법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이른바 ‘발행시장’이 뜨고, 기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거래시장’이 쇠퇴하면서 벤처 기업가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게 됐다. 애널리스트 상당수도 3년 차 정도의 훈련이 끝나면 고속 성장 중인 벤처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2008년 외국계 IB 업계에 취직했던 한 관계자 B씨는 “당시에 외국계 IB가 최고 선호 직군이었고 1년에 국내에 2~3명 밖에 안 뽑던 시절이었다”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외국계 전략 컨설팅과 외국계 증권사 리서치 애널리스트를 대체재로 뽑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도 외국계 IB, 컨설팅, 리서치(애널리스트) 다 합쳐봐야 1년에 20~30명 남짓이었다”며 “당시 입사 선호도 리스트 최상위권의 직군이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최근 들어 벤처기업에 취직해 대형 스톡옵션 등으로 거액의 연봉을 챙기는 사례가 늘어난 것에 대해 “요즘은 외국계 IB도 더 이상 최고 선호 직군이 아니다”라며 “업무 시간이 빡빡하고 업무량이 많아 너도나도 워라밸이 보장되는 벤처로 옮기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뀐 상태”라고 답변했다.
외국계 전략 컨설팅 B사 전직 컨설턴트 출신도 “국내 전략 컨설팅으로 가면 인력 풀이 상상도 못 했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고, 비슷한 레벨이었던 리서치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벤처기업이 강력한 대체재, 혹은 그 이상의 옵션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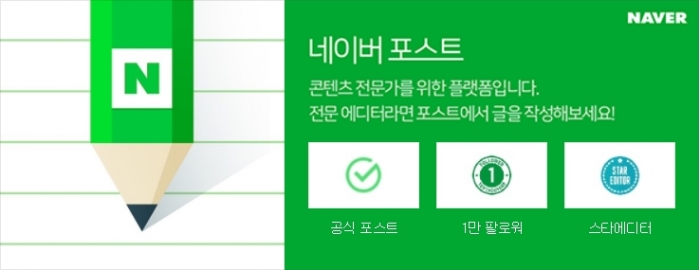
네이버 포스트 같은 대체 옵션도 늘어
셋째, 더 이상 빡빡한 스케줄로 증권사 출·퇴근을 하지 않고 ‘네이버 포스트’ 등을 이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1개월 9,900원의 구독료를 납부하는 구독자가 1,000명일 경우 이미 30대 초반의 애널리스트와 연봉도 비슷하지만, 워라밸은 비교 불가능한 수준으로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한 관계자는 “9,900원 받는 포스트들의 수준을 보면 심각하게 엉망”이라며 “훈련이 좀 잘된 애널리스트가 월 10만원, 100만원씩 받는다는 이야기에 납득이 안 됐지만, 9,900원짜리를 보면 납득할 수밖에 없다”는 평을 내놓기도 했다.
네이버 포스트는 네이버의 블로그 확장 서비스로, 네이버 화면 하단에 노출되면 1일 수십만 명의 유입이 가능하다. 해당 포스트가 고급 콘텐츠로 네이버 편집팀에 인식될 경우 각종 광고 요청과 함께 구독료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데다 자체 콘텐츠 판매도 가능해 연간 수십억의 수익을 올리는 팀이 구성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제 끝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4년 1,500명에 이르던 애널리스트가 2022년 7월 기준 1,029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등 서비스가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1,094명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두 신생 증권사는 아예 리서치팀조차 운영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상장주만 분석하면 됐지만 지금은 해외 주식, 국내 비상장기업, 디지털 자산 등으로 분석 범위가 확대되며 업무가 가중됐다. 여기에 외부 영업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애널리스트들의 부담은 한층 심해졌다. 적당한 훈련이 끝난 인력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문사,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등의 서비스가 고속 성장하고 있는 만큼, 고민 없이 이직하는 사례도 더 늘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3년 고생해서 이직하는 용도 이상으로 애널리스트 직군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글로벌 자금 경색과 금리 상승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더더욱 분위기는 위축되어 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