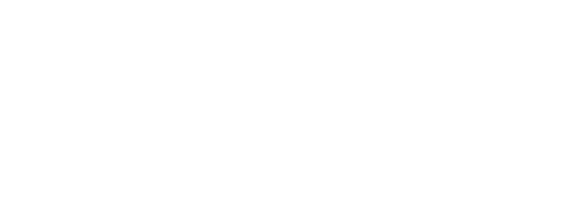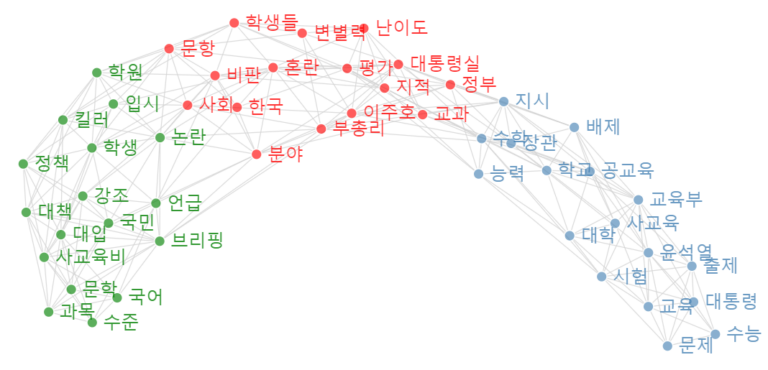[기자수첩] Z세대가 취업을 못하는 이유 ④
스타트업 관계자, ‘첫 직장의 명성은 무의미한 시대’ 주장 Z세대 취직이 힘든 또 하나의 이유는, 눈높이 조절의 실패 훈련 안 된 대기업 인재보다 스타트업서 여러 업무 거친 인재가 더 낫다
구직자들 사이의 속설로 ‘첫 직장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표현이 있다. 어떻게 해서든 기를 쓰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인생이 쉽게 풀린다는 뜻이다. 이름 없는 평범한 직장을 들어가게 될 경우 취업 시장에서 밀려난, 별로 실력 없는 인재일 것이라는 신호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 직장이 인생을 좌우한다?
의료분야 인사 컨설팅 전문업체 메디랩스에 따르면 의료 등의 기술 중심 분야에서는 전 직장이 이직 및 재취업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분석한다. 보통 큰 병원 출신일수록 직무 후 평가(레퍼런스 체크, Reference Check)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개인 병원일수록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가 덜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특정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신경을 쓸 뿐 어떤 병원 출신인지만 따지는 경우는 되려 고용하는 병원의 업무 역량에 의문을 품게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많은 구직자가 자신의 업무 역량 대비 경쟁률이 높은 회사에 취직을 못 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회사의 채용은 훨씬 더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것이 전직 S모 대기업 인사 담당자 A씨의 말이다. 단순 시험 점수와 간단한 면접으로 확정된 인원을 채용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과 달리 대기업만 해도 특정한 규격에 맞지 않은 인재를 뽑지 말아야 한다는 내부 규칙이 있는 만큼, 해당 리스트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후보군을 배제하는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해외 마케팅 회사의 국내 계열사로 이직한 한 직원은 “전 직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스타일의 다양한 직원들을 만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았다”며 “팀장에게 틀렸다고 따지고 들거나 팀장의 무능함을 더 위의 보스에게 직접 찾아가 불평하는 스타일은 제가 다닌 대기업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경우”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A씨는 위의 사례에 대해 “업무 역량이 압도적으로 뛰어나 보이는 SKY나 해외 명문대 등의 인재를 뽑아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판단 아래, 사내 인력 대비 고스펙이거나 면접 중 드러나는 진취성 등이 대기업 문화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보통 그런 인재들이 대기업에 원서를 내는 경우 자체가 드물다”면서 “소위 강남 출신, SKY 및 해외 명문대 출신에게서 자주 보이는 성향인데, 일찍부터 해외 1군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인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쌓은 분들인 만큼, 국내에서도 대기업을 목표 직장으로 잡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름 없는 직장에 다녔던 지원자는 ‘나쁜 인재’?
S대 경제학부 출신으로, 친한 선배와 몇 년간 사업을 하다 이직을 노렸던 경험을 공유한 현재 매출액 1,000억대의 중견 스타트업 ‘C-level’의 담당자 B씨에 따르면 “친구들처럼 외국계 증권사로 이직하려고 했는데 직장 이름을 보고 서류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국내 증권사를 잠깐 거쳐 실력 검증을 받는 절차를 밟기도 했는데 그건 도전했던 것에 대한 비용 지불 아니겠는가”라며 실제로 현재의 5060세대가 첫 직장, 혹은 전 직장의 명성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본인이 유사한 경험을 겪은 탓에 “어차피 어느 직장 출신인지는 무의미한 시대고, 오히려 대기업에서 제대로 훈련 못 받아서 엉망인 인재를 뽑는 것보다 스타트업에서 여러 업무를 다 거친 만능형 인재가 백 배는 더 낫다는 것이 업계 전반적인 공감대”라며 ‘첫 직장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속설이 효력을 잃고 있는 시대라는 평을 내놨다.
B씨의 학부 동기인 또 다른 스타트업 대표 C씨는 “B씨는 이미 학부 때부터 날고 긴다고 소문났던 인재인 친구”라며 “첫 직장이 그 당시 아저씨들 눈에 이상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우리 세대가 회사의 주력인 IT 업계나 벤처 업계에서 그만한 인재를 못 뽑는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아저씨들처럼 구닥다리 채용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답변했다. B씨가 거쳐 간 몇몇 중견 스타트업에서도 “업계 내에 몇 안 되는 최상위 클래스의 CFO 후보군”이라며, 오히려 첫 직장을 외국계 증권사 및 외국계 컨설팅 회사로 선택했던 당시 동기 인력 풀보다 월등하게 나은 인력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사실 원래 갔었어야 하는 직장이 고생해서 찾은 첫 직장
면접 경험만 1,000회가 넘는다는 A씨는 “취직 중에 불만이 있는 구직자가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과거시험 보던 시절처럼 회사가 1개 밖에 없는 경우, 또는 공무원시험처럼 문제가 애매모호하거나 억지 암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회사 면접이 크게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회사 면접을 ‘광탈(바로 탈락)’했다는 이야기는 성격이 대기업에 안 맞거나 아예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무팀 공인회계사(CPA)들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 B씨도 “‘감가상각이 10 줄어들면 재무제표 각 항목이 어떻게 바뀌냐’는 간단한 중급회계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회계사들이 많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대부분의 인력이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 탈락’인 지원자는 무모하게 대기업을 준비할 게 아니라 본인 역량을 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또한 대기업 취직이 계속 힘든 사람은 만에 하나 몇 년간 준비해서 기적같이 취직한다고 해도 역량 부족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행정고시 재경직 사무관 D씨도 “장수 지원 끝에 가끔 합격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직적격성평가(PSAT) 시험을 억지로 통과하신 분들 대부분이 무능해서 공직자 사회 내에서도 승진 열외가 되거나 밀려나기 일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Z세대 취직이 힘든 또 하나의 이유는 눈높이 조절의 실패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신의 역량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역량 평가에 맞춘 도전을 이어가야 함에도 그런 판단이 부정확하거나 일부러 외면하다 보니 시장의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B씨는 “Z세대는 소위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이 심해서 조금만 틀렸다고 지적해줘도 울면서 퇴사하는 세대”라며 “자기 역량이 부족해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의 숫자만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